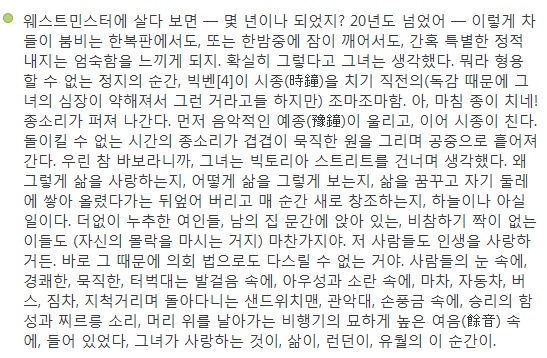티스토리 뷰
20191029
처음 책으로 읽었을 때, 지영의 '딴 사람 되기'는 통쾌했다. 내가 참느라 하지 못했던 걸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좋았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딱 내 얘기고 경험이었다.
영화는 남편과 친정엄마만 바꾸면 거의 내 일기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 취업, 결혼, 출산, 경력단절, 직장복귀에 이르는 과정과 에피소드들도 비슷해서 2019년 현재의 이야기임에도 나는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다.
몇 년 전 책으로 읽었을 때와는 달리, 영화로 보면서는 지영의 '딴사람 되기'에 궁금함이 생겼다.
왜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친정엄마, 죽은 선배 언니, 할머니의 목소리를 빌어 지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하고.
용기가 없어서? 내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검사비 35만 원이 아까워서 되돌아온 지영이 정신과 의사를 다시 찾아가고, 속마음을 꺼내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부터는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 싶었다.
(한 알에 3만 2천 원인 공진단을 시아버지, 남편, 아이만 해주다가 작년에 처음 나를 위해 열 알 샀던 것이 생각났다. 오죽하면 공진단 사서 먹던 날의 일기 제목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진 날'이었다. ㅎㅎ)
영화 초반의 지영은 산 사람 같지 않았는데, 중반부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고, 끝날 무렵 즈음에는 숨도 쉬고 말도 하는 진짜 '사람 '같았다.
집에 돌아올 때 즈음엔 이런 생각도 들었다. 82년생 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아이 낳다 죽은 지영의 선배 언니, 두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교사의 꿈을 접은 지영의 엄마, 당신도 여자이면서 평생을 남자(손자까지)를 떠받드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온 지영의 외할머니( 우리 엄마 같은 분)까지 전 세대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런데도 계속 외면할 거냐고, 선배 언니, 엄마, 할머니의 목소리를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82년생 김지영을 보는 감독, 감독의 영화를 보는 나, 영화를 본 나를 글로 다시 바라보는 나. 그런 나를 글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다.
지영을 바라보는 감독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아이를 바라보는 이현의 글도 생각났다.
사실 어젯밤엔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 내 일기를 내가 왜 극장까지 와서 보고 있는 거지 싶어서였다.
지영이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할 때, 아이를 씻길 때, 욕실 타일 가득 칠해놓은 물감을 지울 때, 명절이 끝나갈 무렵 시누이 등장으로 다시 명절 2막이 시작될 때, 베란다에 선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 나는 다 알 것 같고 실제로 다 안다. 우는지, 웃는지, 땀을 흘리는지 어떤지....
내겐 일부러 떠올리지 않고 살던 내 3,40대를 볼 수밖에 없던 힘든 시간이었다.
지영과 띠동갑인 여자 감독은 자신의 첫 작품으로 82년생 김지영을 선택했고, 지영과 동갑이자 감독과 같은 나이인 나는 둘을 바라보면서, 떠올리기도 싫어서 덮어두었던 나의 3,40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쩌면 좀 더 들여다볼 용기가 생길 것도 같다.
'하루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화하는 날 (0) | 2019.10.31 |
|---|---|
| 엄마의 엄마가 되기로 한 날 (0) | 2019.10.30 |
| 남의 목소리라도 필요했던 날 (0) | 2019.10.28 |
| 김정자만의 학교를 만드는 날 (0) | 2019.10.27 |
| 화가 '모지스'를 읽은 날 (0) | 2019.10.2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사서
- 가객
- 한의원에서 일하기
- 아카바 유지
- 구몬영어
- 학습지
- 댓글
- 0초사고
- 알바
- 냉이주먹밥
- 서도민요
- 구몬쌤
- 도스토예프스키
- 입문코디교육
- 그림
- 한의원에서 알하기
- 주부학교
- GC클럽
- 수심가
- 독서모임
- 아저씨의 꿈
- 필사
- 노래
- 초한가
- 한의원
- 도서관
- 보르헤스
- 82년생 김지영
- 엄마
- 일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