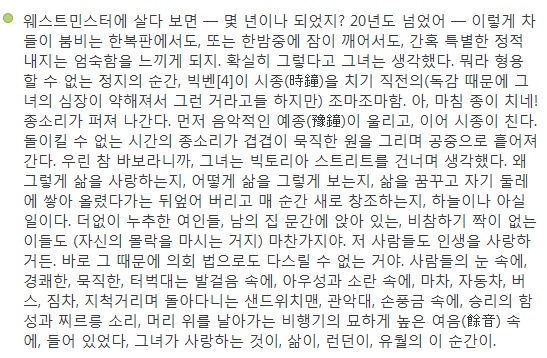티스토리 뷰
201900708
녹음된 수업을 돌려 듣다 보니 첫 수업 때가 생각난다. 기계적으로 ‘약사~~아아아아아아~’를 소리 내면서, 올라가는 ‘아’는 몇 번이고, 내려오는 ‘아’는 몇 번인지 몰라 손가락으로 세면서 불렀던, 세면서 부르면서도 계속 틀려서 집에 와서 녹음을 들으면서 겨우 그 횟수를 알아내곤 해서 한없이 답답했던 때다.
정해진 횟수는 없고 능력 되는 만큼 여러 번 떨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몇 번을 떠는지 굳이 세지는 않고, 내 호흡에 맞게 끊어지기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 마무리하곤 한다. 그 지점을 잘못 찾아서 부르다 만 듯 끊길 때도 있지만, 숫자를 세지는 않고 있다. 능숙해져서라기보다는 하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것은 시간의 은공이다.^^
수업 때마다 지적받는 부분조차 부분 연습 없이 흘러오다 보니, 어느 순간 스킬만 되새기느라 노래가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수심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노래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에는 얼마나 깊게 공감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 표현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배운 대로 부르기도 벅차다는 생각에 내 감정을 표현할 생각을 아예 내려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2년 배운 만큼의 스킬과 함께 2년 배운 만큼의 감정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담으려고 해야 한다, 시도라도 해야 한다.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파먹고, 떠는 스킬을 표현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글자 한 자, 문장 한 줄, 여백이 품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감정까지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인 것. 그것을 시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첫 수업 때 ‘약사 몽혼으로 행유적이면’의 9 글자를 69글자로 늘여 배우던 날에 느꼈던 수심가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은 지금의 내 노래에 얼마나 들어 있는 것일까?
노래를 또박또박 읽기 바쁘던 네 번째 수업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제가 전공생들한테도 가끔 하는 말인데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엔 그림이라거나 정경? 음악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잡히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나)이 부르는 것을 듣고 그 분위기가 상상이 돼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성대모사 같은 것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누구를 흉내 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TV에 나왔을 때의 표정이나 몸짓, 갖고 있던 감정들을 상상하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노래할 때도~ 사람들이 노래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도 그건 거 같아요. 표현이 없어요. 배운 대로 여기 5번, 여기 6번, 선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노래가 어떤 노래고, 어떤 사람이 불렀을 거고,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이 노래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일기에는 첫날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았다.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꼭 남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무엇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나만의 간절함을 담아 부르시면 됩니다.”
그동안 꼼꼼히 읽지 않고 꽂아 둔 이옥봉의 시집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그리고 이옥봉의 삶에 대해 써 놓은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어 본다. 그리고 수심가의 가사가 된 시를 쓸 때 이옥봉의 상황을, 심정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남자에게 선택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쟁취한 결혼. 그렇게 맺은 남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시 한 편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 시를 쓸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억울했을까? 야속했을까? 그저 아팠을까? 아렸을까? 후벼 팠을까? 따끔거렸을까? 눈물이 가슴속에 꽉 차서 갈비뼈가 뻐근했을까? 껍데기만 남은 듯 텅 빈 느낌이었을까?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렸을까? 스트레스로 몸속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을까? 소리 없이 울었을까? 통곡을 했을까? 아파서, 시를 쓰다가 병이 나지는 않았을까? 이미 마음 여기저기에 금이 간 상태로 시를 쓴 건 아니었을까? 남편과 살던 10년은 시를 그리워하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10년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두 개의 10년이 준 상처로 시는 살찌우고, 정작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느낌들을 상상해보고 나의 경험들 속에 찾아보고 이옥봉이 된 듯 불러보고 싶다. 이옥봉의 이런 감정들이 400여 년을 전해 내려 와서 수심가를 부르는 여러 사람들의 노래 속에 조금씩 스며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노래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든 하나 - 창고 속에서 - (2) | 2019.08.09 |
|---|---|
| 여든 - '누군가 노래를 하고 있구나' - (2) | 2019.07.19 |
| 일흔 여덟 - 붕~~~ - (0) | 2019.07.12 |
| 일흔 일곱 - 내가 나를 붙들고 - (2) | 2019.07.02 |
| 일흔 여섯 - 너의 의미 - (2) | 2019.06.2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아카바 유지
- 구몬쌤
- 사서
- 독서모임
- 도서관
- 그림
- 냉이주먹밥
- 0초사고
- 초한가
- 노래
- 보르헤스
- 일기
- 82년생 김지영
- 알바
- 서도민요
- 주부학교
- 댓글
- 필사
- 아저씨의 꿈
- 학습지
- 가객
- 한의원에서 일하기
- 수심가
- 한의원
- GC클럽
- 한의원에서 알하기
- 엄마
- 구몬영어
- 도스토예프스키
- 입문코디교육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