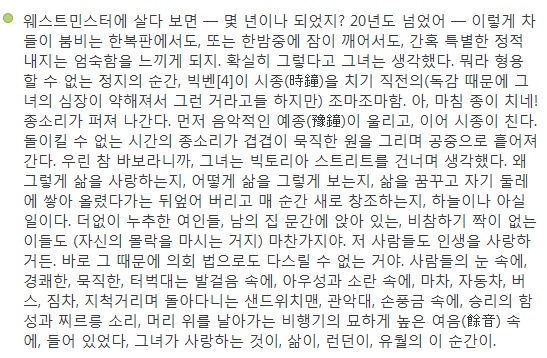티스토리 뷰
2019. 4. 1
“근데 이제 제가 50살이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떻다는 것인지...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말인데 암튼 나는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단위가 20년 전, 30년 전 일이고, 생각이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시절이 다 끝나버린 느낌? 그래서 꽃을 보는 것이 너무 슬퍼요.”
서른을 넘긴 지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이미 인생의 반을 산 내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그 날의 나는. ‘싶었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느닷없이 터져 나온 말이라서 그렇다.
최근에 아버지의 하나 남은 형제인 작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작은 아버지의 병세에 따라 부모님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평생을 약국 안에서 일만 하시다 입원하시고도,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살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시 돌아가 빨리 약국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엄마와의 전화로 전해 들으면서 삶의 덧없음과 애착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 일도 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런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 울적해하신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몹시 중대한 일을 치르고 있는 듯 비장해하시는 우리 엄마, 특히 엄마를 통해 듣는 작은 아버지의 병세는 말 그대로 ‘오늘내일’ 혹은 ‘마음의 준비’까지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그 모든 이야기와 그로 인한 엄마의 감정을 내게 쏟아내시고는 공감받기 원하셨다. 엄마에겐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수시로 죽음에 대한, 병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는 것은 내게도 우울함과 피곤함을 남겼다.
평소 죽음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부모와 가장 가까운 분의 병세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다 보니 앞에 줄 선 사람들이 확 줄어들면서 갑자기 내 순서가 앞당겨질 때처럼 내 부모의 순서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
지난 3월에 하던 일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도 있고, 이삼 년 전부터 하던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도모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어르신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단어 ‘관절’이 나와 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한 친구는 2주 전에 다리수술을 받았다.
염색이며 다초점 렌즈며 뱃살이야기 한 지는 훨씬 더 오래 전의 일이다.
입모양을 보면서 연습하려고 꺼내든 손거울로 내 목의 섬세한 주름을 발견했을 때의 황망함이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일 뿐인데 이런 순간들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고 과장되게 삶 속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다. 하필 이런 봄날 지금 내게…
나의 꽃 타령에서 시작된 하소연에 선생님은 진도를 잠시 멈추셨다. 초한가와 난봉가를 건너뛰고 수심가, 영변가와 해주아리랑만 부른 다음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 진다고 설워마라’로 시작되는 창부타령을 불러보자고 하셨다. 전에 경기민요를 할 때 배웠던 노래인데도 오히려 배웠던 노래라 잘 부르기 힘들었다. 두 선생님의 스타일이 섞여서 이도 저도 아닌 노래가 되는 것 같다. 영 제대로 부르지를 못하자,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공도라니 백발이요 면치 못할 건 주검이로다’로 시작되는 창부타령을 새로 알려주셨다.
선생님께 창부타령 두 곡을 '처방' 받고 지난 1주일 내내 거의 매일 반복해서 들었다. 버스 창밖으로 개나리가 보일 때도 들었고, 친구들과 석촌호수의 벚꽃을 보러 갔을 때도 들었다. 우리 아파트 화단에 핀 튤립이랑 벚꽃, 조그맣게 봉오리가 잡힌 철쭉을 볼 때도 들었다. 하늘이 맑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들었다. 감기약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꼬박꼬박~
실력 향상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처량 맞게도 불러보았다.
봄날에 대한 기억이 하나 더 생긴 날~~~
'노래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흔하나- 서툰 듯 매력적인 (2) | 2019.05.11 |
|---|---|
| 일흔번째 '즈음'- 4월의 일기를 5월에 쓰다 - (0) | 2019.05.04 |
| 예순여덟 - 1년 10개월 만에 달라진 것 - (0) | 2019.03.30 |
| 예순 일곱 - 지금은 장작이 필요해 - (0) | 2019.03.18 |
| 예순여섯 - 그 순간에 집중하다 - (0) | 2019.02.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한의원에서 일하기
- 한의원에서 알하기
- 노래
- 도스토예프스키
- 엄마
- 보르헤스
- 초한가
- 일기
- 서도민요
- 가객
- 수심가
- 필사
- 댓글
- GC클럽
- 입문코디교육
- 82년생 김지영
- 한의원
- 도서관
- 구몬쌤
- 알바
- 주부학교
- 아카바 유지
- 학습지
- 구몬영어
- 아저씨의 꿈
- 냉이주먹밥
- 그림
- 독서모임
- 사서
- 0초사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