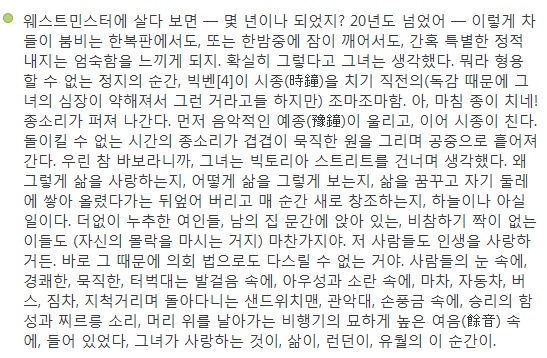티스토리 뷰
-제18th 강남 전통예술경연대회 참관기(경, 서도 부문) -
2016, 17년에 저 무대에 서 본 적이 있다. 두 번의 대회 참가와 한두 번의 대회 참관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말한다면, 이 대회의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객석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속삭이며, 가끔은 속삭이는 정도 그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대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객석에 앉은 개개인의 소양이 빚어낸 해프닝 같은 것이지만, 이런 모습은 대회의 품격이나 수준을 가늠하게 할 요소가 될 수도 있기에 주최 측에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잘한 소음을 견뎌야 한다는 건 참가자에겐 고도의 집중력을, 청중에겐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 서도 부문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참가자 복장을 한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내 앞 쪽 좌석으로 모여 앉기 시작했다. 서로 다 아시는 사이인지 대회가 진행되는 중인데도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셨다. 대회 중에 담소라니, 곧 조용히 하시겠지 생각해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년 전 이 대회장의 객석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자신의 일행을 큰 소리로 부르는 분도 본 적이 있어서,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견디면서 보리라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나보다 한참 연장자인 분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 참가자가 느릿느릿 무대로 들어서자,
“밥도 안 먹고 나왔나, 왜 저래?”
“아 방아타령, 방아타령 어려운데…”
“아, 오늘 (방아타령) 처음 나오네.”
스포츠 경기의 해설자와 캐스터의 해설을 듣고 있는 것만 같다.
명인부 참가곡으로 제비가가 연달아 나오자,
“제비가? 제비가? 제비가를 한다는 거지? 아이~~ 수심가를 불러야 돼.”
“제비가 풍년이다.”
한 참가자가 퇴장하자,
“노래 개판(으로) 불렀는데?”
참가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런 생각을 뒤쪽에 앉은 혹은 앞쪽에 앉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줄이거나 그런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방아타령이었나? 참가자의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기도 했다. 정말 노래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듯 보였지만,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없으신지 편안한 음성으로 흥얼거리셨다. 지금은 공연이 아니라 대회이고, 무대 위의 사람은 민요 연주자가 아니라 민요대회 참가자인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듯 하는 것은 실례이지 않을까.
나뿐 아니라 거의 전 좌석의 청중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이 분들을 쏘아보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만의 해설 모드를 유지하셨다. 나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좌석의 청중들도 견디고 있었구나, 멀어서 달려올 수 없었을 뿐…
이 적절치 못한 소음에 피곤함이 쌓여가던 중, 드디어 이 분들 중 한 분이 결정타를 날리시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앞좌석의 등받이를 ‘탁! 탁!’ 소리 나게 두들기면서 26번 참가자 노래의 박자를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리는 앞의 수다에 비해 소리가 훨씬 큰 것으로 무대 위의 참가자와 고수에게 들릴 만한 소리였다. 참가자에겐 두 명의 고수가 생긴 셈인데, 노래하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 내가 다 걱정이 되었다.
나는 26번 참가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앞자리의 어르신들을 향해 몸을 반으로 꺾은 채로 조용히, 하지만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갔다.
내 검지 손가락으로 내 입을 누른 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어르신의 팔을 톡 하고 두드렸다. 부채의 주인공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두 팔로 커다란 X자를 만들어 ‘하지 마세요’라고 입 모양으로 얘기를 했다. ‘넌 뭐냐?’ 하는 표정으로 잠시 나를 보셨다. 내가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내 쪽을 보시는 것 같았다. 좀 더 빨리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제발 조용히 해 주시길 바랐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 어르신은 두 번, 세 번 연거푸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나를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해 보였다. 옆 좌석의 어르신 한 분이,
“아, 조용히 하래잖아.”
이 분은 더 커진 목소리로,
“조용히는 무슨? 축젠데…”
참가자가 몇 주, 몇 달씩 연습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4~5분의 시간은 고수의 박, 청중의 경청, 그리고 추임새 외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다. 참가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앞사람이 들어가고 다음 사람이 노래할 준비를 하는 1,2분 사이에도 참가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게다가 이미 민요를 하는 분이고, 그 자신 또한 몇십 분 전에 참가자였던 사람이라면…
귓속말도 있다. 귓속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누른 채 휴대폰 글자판에 타이핑을 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메모지에 써서 대화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 대한 각자의 심사평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대회가 끝나고 자신들만의 심사평을 해도 충분하다.
2019년 5월 15일 제18th 강남 전통예술경연대회장 객석에 앉아 몇 사람이 만든 소음을 오랫동안 견딘 다수의 청중의 하나였던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회를 즐기는 청중의 에티켓에 대해서.
대회 직후 주최 측인 강남문화원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직접 건의를 했다. 참가자가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청중이 조용히 감상할 수 있게 떠드는 청중들을 제지할 안내요원을 객석 사이사이 배치해 달라고 말이다.
이 대회뿐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대회가 발전하는 만큼 청중의 수준도 함께,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축제를 즐기는 방법'도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
'대회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도 그려본 날 (0) | 2019.10.22 |
|---|---|
| 5분에 담긴 한오백년 (0) | 2019.10.13 |
| 2년 만에 나가다 (2) | 2019.08.18 |
| "완벽한 노래는 저도 못합니다" (7) | 2019.05.25 |
| 하나. 2년째 객석에서만 바라보다 (2) | 2018.07.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필사
- 학습지
- 한의원에서 알하기
- 서도민요
- 그림
- 아저씨의 꿈
- 아카바 유지
- 도서관
- GC클럽
- 댓글
- 노래
- 수심가
- 초한가
- 가객
- 입문코디교육
- 사서
- 한의원에서 일하기
- 엄마
- 구몬영어
- 알바
- 한의원
- 주부학교
- 82년생 김지영
- 냉이주먹밥
- 구몬쌤
- 0초사고
- 보르헤스
- 독서모임
- 도스토예프스키
- 일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