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 4. 29
4년 전 처음 '한 송이 떨어진 꽃을~'을 들었을 때, 첫 가사만 듣고도 이미 슬픈 노래라는 느낌이 왔다. 후렴구에 가서는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라고 체념한 듯, 달관한 듯 노래를 하지만, 본절의 가사를 보면 위로(한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 진다고 설워마라)와, 현실 파악(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번연히 알건마는)과 비장함(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원망(버림도 쓰라리거든 무심코 밟고 가니)’ 하소연(근들 아니 슬플쏘냐), 한탄(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살겠네) 등이 다 들어있는 슬픔의 종합 선물세트 같다.
‘낙화 진다’는 말의 어감이 마음에 들었거나 낙화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였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꽃이 진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불러보면서 하게 되었다.
‘꽃이 진다’는 말 자체에도 슬픔이 배어있는데, ‘떨어질 락(落)’의 격한 어감 때문인지 꽃이 살며시 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 같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기에 어렸을 때 언니들이 듣던 시낭송 테이프 속의 시, 이형기 시인의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첫 구절에 꽂혔는데 시낭송 테이프 속의 여자 성우가 얼마나 애절하게 낭송을 했던지 낙화의 뜻을 알기도 전에 슬픔이 먼저 덮쳐왔던 시다. -’의 비장미까지 더해져 반백 살의 감성을 건드렸다. ^^
지금보다 더 민요에 대해서 몰랐던 2년 전에는 소리를 키우느라 -예전 경기민요 선생님의 표현을 옮기자면, 그때 나의 목소리는 당시 5살이었던 손녀의 목소리 (굵기, 크기)와 비슷했다고 한다. - 크게 부르기 바빴던 때였다.
봄 내내 심란해있던 내게 기분 전환의 의미로 예전에 배웠던 창부타령 몇 곡을 불러 보자고 하신 것이 오늘까지 4번의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 더 나이 먹고 만난 창부타령은 산 세월만큼의 감성과 함께 그때와 또 다른 노래가 되어 나타났다.
‘한 송이~~’는 이미 배웠음에도 내가 잘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서툴고 주저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였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전혀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가사의 창부타령을 알려 주셨다. ^^ 심지어 내가 가진 책에 가사 조차 없는... 덕분에 오로지 선생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다.
‘공도라니 백발이요 면치 못할 건 주검이로다~’로 이어지는 노래가 그것이다. 특히 뒷부분의 ‘우리 초로인생이야 한 번 가면은 영절이로다.’라는 가사는 4월 내내 흥얼거리고 다닐 정도로 내게 꽂힌 가사이다. 선생님은 '초로(草路)'를 ‘길 가에 풀떼기 같은’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풀'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풀떼기라고 하셔서 더 와 닿았다. 가사 없이 소리만 들었을 때 초로(草路)가 아니라 초로(初老)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느 쪽이어도 영절(永絶)이긴 마찬가지다.
배우니까 잘하고 싶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던 서도민요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4월 한 달 창부타령을 부르는 동안은 마음이 편했다. 2년 전 경기민요를 배우던 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한 송이~’를 다시 불러 보고, ‘길가의 풀떼기’라는 멋진 해석에 탄복하고, 김소월의 시를 샘플링해서 가사를 지은 작사가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봄꽃이 다 떠나간 지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봄날의 여행을 다녀온 듯하다.
'노래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흔넷 -"습관이에요!" (2) | 2019.05.30 |
|---|---|
| 일흔 셋 -떠올리되 따라 하지 말 것 - (2) | 2019.05.22 |
| 일흔하나- 서툰 듯 매력적인 (2) | 2019.05.11 |
| 일흔번째 '즈음'- 4월의 일기를 5월에 쓰다 - (0) | 2019.05.04 |
| 예순아홉 - 꽃 타령을 하다가 창부타령 - (0) | 2019.04.11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한의원
- 입문코디교육
- 댓글
- 보르헤스
- 노래
- 알바
- 독서모임
- 초한가
- 학습지
- 한의원에서 일하기
- 82년생 김지영
- 0초사고
- 주부학교
- 한의원에서 알하기
- 도스토예프스키
- 구몬영어
- 서도민요
- 수심가
- GC클럽
- 엄마
- 사서
- 그림
- 구몬쌤
- 필사
- 아저씨의 꿈
- 가객
- 도서관
- 냉이주먹밥
- 아카바 유지
- 일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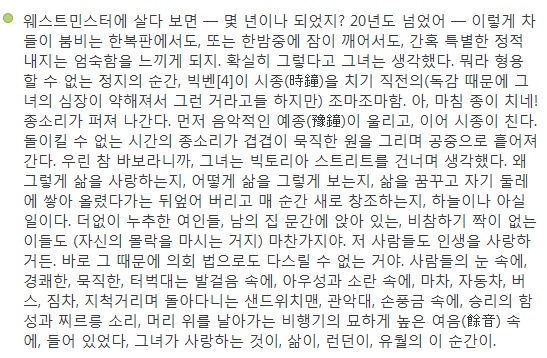
 공개수업 일흔둘.m4a
공개수업 일흔둘.m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