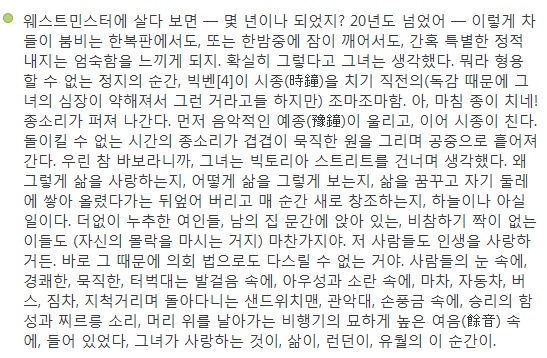티스토리 뷰
20200128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들들만 따로 불러서 낮잠을 재운다. 밥을 한 번 더 먹게 하거나, 술을 권하시거나, 이것저것 싸주시는 일들을 출발 직전에 시작하셔서 최소한 30분은 더 시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아들들 설거지시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그게(15~25명이 20가지 이상의 반찬과 밥, 술을 먹은 설거지거리) 무슨 일이라고 남자들을 시키냐'며 역정을 내신다. 어머니의 동서이자 남편의 작은 어머니는 남편의 고무장갑을 낚아챈다...>
한 해 한 해 기억을 더듬어보면 설, 추석 20년여간 40여 가지의 명절 스토리가 떠오른다.
잘하려 애쓴 시기도 있었고, 견딘 시기도 있었으며, 탈출할 생각도 했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아깝고 허무했다. 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명절을 내 정성과 노력을 담아 치러야 했으니까.
지난 2018년 설 연휴 마지막 날, 나는 사고를 쳤다. 가족들과는 나누지 못한 나의 명절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투고한 것이다.
내가 보낸 글의 제목을 기자가 '명절 노예 20년, 이번 추석엔 바꿀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실었고, 실명으로 글이 실렸다가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면서 가명을 권했다. ^^ 그 무렵 읽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제목인 '댈러웨이 부인'을 가명으로 썼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명절 이야기를 글로 쓰는데 마음이 설렜다. 다음 날 글이 실리고 사람들이 읽은 흔적들은 위로가 되었다. 내 얘기를 읽어주었을 뿐인데도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명절을 둘러싼 일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도 좀 더 정돈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글쓰기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의 제목처럼 '이번 추석(2018)엔' 바꾸지 못했다.
내가 친정을 먼저 가면, 시댁과 친정의 가족 모두와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시댁에 도착하면 손위 동서들은 이미 없을 것이고, 시댁 먼저 들르는 내 언니들을 친정에 일찍 도착한 나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설을 지내고 시댁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말했다.
< 결혼 20년 동안 시댁에 먼저 갔으니 앞으로 20년은 친정을 먼저 가겠습니다. 내 부모님 건강하실 때 나도 1부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시아버지: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 그건 아니 될 소리여.
남편: 그런 얘긴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큰동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주버니 1: 침묵
아주버니 2: 침묵+아침상 설거지
내 아이: 왜 우리 엄마는 자기 부모 보러도 맘대로 못 가는데요?
내 부모: ○서방 하자는 대로 해라. 여기 먼저 와도 나는 하나도 안 반갑다.
내 언니 1:그럼 우린 명절 때 못 만나ㅜㅜ( 언니도 친정 먼저를 실천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한 명이 가면 다른 한 명이 와서 부모가 자식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 일인데, 시댁 친정을 통틀어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은 16살 내 아이뿐이었다.
숨이 콱 막혀왔다. 나와 합의한 적 없이 만들어진 관습을 내게도 신앙처럼 떠받들라고 강요한다. 하던 대로 하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껏 잘해왔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고 내 '가족'이 내게 말한다.
2019년 추석엔 혼자만의 추석을 보냈다. 남편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아이에게만 호텔 이름을 말해둔 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 앞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명절 없는 세상으로 시공간을 이동한 것 같았다. 마음속 쓰레기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인데 내 집 앞 현관에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집에서 나온 지 30분쯤 지났을 때, 남편, 시어머니, 손위 동서, 우리 엄마에게 나의 안식일을 알렸다.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같이 전했다.
그리고 오전엔 서점에서 놀다가 체크인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해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전 부치는 냄새, 갈비 찌는 냄새도 없다. 나를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도, 내 이름은 모르고 질부로만 알고 있는 친척들의 목소리도 없다. 피곤함도 꾀죄죄한 몰골의 나도 없다. 해야 할 음식도, 쌓여있는 설거지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숨만 쉬고 있어도 좋다.
혼자 호텔에서 보낸 2박 3일은 퇴직금 받아서 간 20대 때의 배낭여행보다, 아이와 둘이 간 첫 해외여행보다도 좋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인 것을 20여 년만에 다시 알았다. 아내를 걷어내고, 며느리를 걷어내고, 딸도 엄마도 걷어내니 오랫동안 방치해 둔 내가 드러났다. 아직 내가 있었다. 다행히 아직 살아는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맞은 설, 2020 시댁의 설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큰 아주버니가 설거지를 통째로 하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남자 조카들이 적극적으로 상치우기를 같이 했다. 남편과 시동생이 각각 한 끼 식사의 설거지를 전담했다. 시부모님이 하기 힘든 집안일을 아들들이 맡아했다. 내 이름도 모르는 친척들 중 몇몇이 내가 친정에 가려고 길을 나설 무렵에 시댁에 도착하긴 했지만, '저는 친정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나왔다. 생각해보니 친정에 가려다 다시 들어와 상을 차린 때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동안 주어진 며느리 역할에 순응하느라 말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참은 건 내 잘못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할 얘기를 해서 서로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만든 것은 잘한 일 같다.
내가 시댁의 문화를 바꾸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시댁과 나의 다름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모습이길 바랄 뿐이다.
나는 전보다 시댁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2018. 02.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6344&CMPT_CD=SEARCH

'하루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맘에 안드는 날 (0) | 2020.02.01 |
|---|---|
| 졸음이 쏟아지는 날 (0) | 2020.01.30 |
| 문자 보내기를 배우는 날 (0) | 2020.01.25 |
| 내일이 설날 (0) | 2020.01.24 |
| 설날 (0) | 2020.01.23 |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서관
- 수심가
- 필사
- 일기
- 0초사고
- 초한가
- 가객
- 한의원에서 일하기
- 사서
- 한의원에서 알하기
- 주부학교
- 아저씨의 꿈
- 입문코디교육
- 알바
- 노래
- 냉이주먹밥
- 구몬쌤
- 댓글
- 학습지
- 82년생 김지영
- 구몬영어
- 도스토예프스키
- 독서모임
- 보르헤스
- 서도민요
- 한의원
- 그림
- GC클럽
- 아카바 유지
- 엄마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